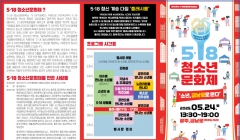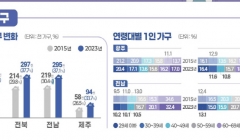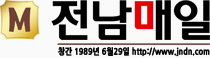박간재 편집국장 |
#한 고승이 동자승과 함께 산길을 걷고 있었다. 그 스님은 성격이 괴팍하고 제자들에게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걸로 유명했다. 어느 날 스님이 동자승과 뒷산을 올랐다. 스님이 먼산을 응시하며 말했다. “심조불산에 호보연자로구나” 동자승은 ‘아하 이제서야 스님께서 법문을 가르쳐 주시려나보다’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깊은 뜻이 담긴거 같은 데 도통 무슨 말인지 짐작이 안갔다. 동자승이 물었다. “스님, 조금 전 하신 말씀은 누가 한 말씀입니까” 고승이 답했다. “수군인용 이란다”
동자승이 다시 물었다. “말씀의 뜻은 무엇이며 그 분은 어떤 분입니까” 고승이 먼산을 가리켰다. “저기를 봐라” 고승이 가리킨 산허리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의 입간판이 서 있었다. ‘자연보호·산불조심, 용인군수’
이 얘기는 성철스님과 수제자 원택의 얘기로 알려져 있다. 원택은 이후 ‘심조불산(心操不山-마음을 잘 가꾸고 조심하면 산(걱정·근심·장애물)이 없어진다’는 법문으로 가슴에 깊이 새기며 지냈다고 한다.
가슴 뭉클한, 신선한 얘기도 울림을 준다.
#지난 7월30일 프랑스 올림픽 앵발리드 양궁장. 차드 국가대표 ‘이스라엘 마다예’ 선수가 쏜 화살이 1점 과녁에 꽂혔다. 2세트 마지막 세 번째 화살이었다. 상대는 한국의 김우진. 김우진은 9발 중 7발을 정중앙에 꽂아넣는 중이었다. 그렇게 그는 ‘1점 궁사’로 이름을 알렸다.
최근 그가 처한 상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제로 떠올랐다. 그의 고향은 아프리카 차드. 프랑스 식민지였으며 현재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한 곳이다.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고 가슴보호대 조차 없이 활을 쐈다. 경기복도 없어 일상복 셔츠를 입고 출전했다. 그는 원래 전기기술자였다. 독학으로 양궁세계에 뛰어들어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그 사연이 한국 기업 ‘파이빅스’에 알려져지면서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앞으로 마다예에게 활과 화살은 물론 가슴보호대, 손가락보호대, 모자, 티셔츠 등 9가지 물품을 후원할 예정이다.
#행복지수 세계 최고인 나라 부탄. 첫눈이 내리면 정부가 그 날을 국경일로 선포한다고 한다. 첫눈을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이라 여기며 하루 동안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다. 첫눈 내린 줄 모르고 늦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 앞에 눈사람을 만들어 주며 행운을 빌어준다. 뒤늦게 일어난 사람은 눈사람을 만들어 준 이웃에 음식을 대접하며 고마움을 전한다. 부탄국민에게 행복이란 특별한 게 아니라 소소한 일상이다.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축복으로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행복의 비결 아닐까.
최근 몇년 간 나라가 혼란스럽다.시스템은 없고 주먹구구 억지만 난무한다. 분열된 민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듯 하다.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그렇고 홀연히 사라져 버린 지도 속 독도가 그렇고 디올백 수수의혹도 그렇다. 젊은 날 대동세상을 외쳤던 족속들은 돌연 변절을 거듭하더니 이젠 극우 끝자락에 고개 치켜들고 서있다.
이들에게 청록파 조지훈 시인의 수필 ‘지조론-부제 : 지조와 변절, 변절자를 위하여’일독을 권한다. 1960년 3월 ‘새벽지’에 발표한 수필로 1950년대 말 극도로 혼란한 정치적 현실을 ‘지조’라는 개념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그는 식민지 시절 친일파 무리들이 해방 이후 과거 친일 행적에 반성은커녕 정치인이 돼 당당하게 행세 하는 모습을 질타하고 있다. ‘지조’있던 일부 정치지도자들조차 거리낌 없이 변절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사속에서‘지조’와 ‘변절’의 길을 걸었던 인물들과 관련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1950년대 말 독재 정권과 이들에게 빌붙어 지조나 신념도 없이 변절을 일삼는 무리들을 점잖게 나무라고 있다. 그가 본 시대는 50년대 말이었지만 2024년 지금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도 부끄러움도 모른 채 어떤이들은 친일을 외치며 활개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분명 역사의 보잘것 없는 한 페이지로 장식될 것은 자명하다.
잔잔한 웃음을 주는 고승의 선문답, 꼴찌에게도 박수 보내는 기업들, 첫눈을 하늘의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부탄인들. 이들이 사는 세상같은 행복의 나라를 만들 순 없을까. 이번 연휴 그런 나라에서 '베드로팅(BED ROTTING-방콕 넘어 침콕)'하며 지친 몸 추스리고 싶다. 노자(도덕경 제73장)가 말한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하늘의 그물코가 넓어 엉성할 것 같지만 촘촘해서 결코 민심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즉 죄 짓고는 발뻗고 살 수 없으며 인벌(人罰)은 피할지 몰라도 하늘이 내리는 천벌 만큼은 피할수 없다'를 되새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