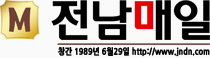нғҒнҳ„мҲҳ |
л¬ёл“қ, м–ҙлҠҗ л•Ңмқёк°Җ к·№лқҪк°•к°Җм—җм„ң ліҙм•ҳлҚҳ м„ лҸҢ(п§·зҹі) н•ң мҢҚмқҙ л– мҳ¬лқј мЈјліҖмқ„ л‘җлҰ¬лІҲкұ°л ёлӢӨ. к°•мқ„ мӮ¬мқҙм—җ л‘” л‘җ л§Ҳмқ„мқҳ мҶҢнҶө м–ём–ҙлЎң мқҢ(йҷ°)кіј м–‘(йҷҪ)мқҳ кё°мҡҙмқ„ мӣҗнҷңн•ҳкІҢ мЎ°мңЁн•ҳкі мһҗ н•ҙм„ң м„ёмӣ лҚҳ м—јмӣҗмқҳ л°”мң„. мқёк°„мқҳ м •мӢ мҳҒм—ӯк№Ңм§ҖлҸ„ кё°кі„л“Өмқҙ мһҘм•…н•ҳкі мһҲлҠ” мҡ”мҰҲмқҢ м„ёмғҒм—җм„ң ліҙл©ҙ м–ҙмІҳкө¬лӢҲм—ҶлҠ” мқјмқҙм§Җл§Ң, н•ңл•Ң к·ё м„ лҸҢмқҖ м ҲмӢӨн•ң мҶҢл§қмқ„ лӢҙм•„ м„ёмҡҙ м„ мқёл“Өмқҳ мӢ м•ҷ мһҗмІҙмҳҖлӢӨ. мһҗм—°мқҳ мқҙм№ҳмҷҖ кё°мҡҙмқ„ мІңлӘ…мңјлЎң м—¬кё°л©° мӮҙм•ҳлҚҳ мӮ¬лһҢл“Өм—җкІҢлҠ” нҸүнҷ”лЎӯкі мЎ°нҷ”лЎңмҡҙ мӮ¶мқ„ мң„н•ң мһҗм—°кіјмқҳ мЎ°мӢ¬мҠӨлҹ¬мҡҙ нҳ‘мғҒ н–үмң„мҳҖлӢӨкі лӮҳ н• к№Ң.
мқёк°„мңјлЎңл¶Җн„° мҳҒмӣҗл¶ҲліҖн•ң кІғмңјлЎң мқёмӢқлҗҳлҠ” лҸҢ. к·ёмӨ‘м—җм„ңлҸ„ мқёк°„ нһҳмқҳ н•ңкі„лҘј к·№ліөн•ҳкІҢ н–ҲлҚҳ кұ°м„қ(е·Ёзҹі)мқҖ м„ мӮ¬мӢңлҢҖл¶Җн„° мҲӯл°°мқҳ лҢҖмғҒл¬јмқҙм—ҲлӢӨ. мӮ¶мқҖ м„ёмӣ”кіј м—ӯмӮ¬мқҳ кёёмқ„ л”°лқј нқ”м Ғмқ„ лӮЁкё°л©° мң мӣҗнһҲ нқҗлҘёлӢӨ. мқёк°„мқҙ кұ°м„қмқ„ мқҙмҡ©н•ҙ л¬ҙлҚӨкіј м„ лҸҢмқ„ л§Ңл“Өкі нғ‘мқ„ м„ёмӣ лҚҳ кІғмқҖ л°”лЎң, мҳҒмғқ(ж°ёз”ҹ)мқ„ мң„н•ң кё°мӣҗмқҳ мғҒ징물лЎң н•©лӢ№н•ҳлӢӨлҠ” мғқк°Ғм—җм„ңмҳҖлӢӨ. к·ё мҳҒмғқмқҖ мЈҪм§Җ м•ҠмқҢмқҙ м•„лӢҲлқј мғқ(з”ҹ)кіј мӮ¬(жӯ»)мқҳ л¬ҙн•ңн•ң көҗмІҙ кіјм •мқҙ мЎ°нҷ”лЎӯкІҢ нҺјміҗм§Җкё°лҘј, лҳҗлҠ” лӢЁм Ҳмқҳ кі лӮң м—Ҷмқҙ мҳҒмҶҚн•ҳкё°лҘј м—јмӣҗн•ҳлҠ” м ҲмӢӨн•Ёмқҳ н‘ң징мқҙкё°лҸ„ н–ҲлӢӨ.
л•Ңл§Ҳм№Ё к°• мЈјліҖ мҡ°мёЎм—җ вҖҳмһ…м„қл§Ҳмқ„вҖҷмқҙлқјлҠ” н‘ңм§Җм„қмқҙ ліҙмқёлӢӨ. л§Ҳмқ„ м•Ҳкёёмқ„ н–Ҙн•ҙ м ‘м–ҙл“Өмһҗл§Ҳмһҗ лІ„нӢ°кі м„ңмһҲлҠ” м„ лҸҢмқҳ нҒ¬кё°к°Җ м–ҙл§Ҳм–ҙл§Ҳн•ҳлӢӨ. н•ңлҲҲм—җ ліҙм•„лҸ„ лӮЁм„ұмқ„ мғҒ징н•ҳлҠ” лӘЁмҠөмқҙлӢӨ. мЈјліҖмқ„ л‘ҳлҹ¬ліҙлӢҲ м–ҙл“ұмӮ°, мҡ©м§„мӮ°, ліөлЈЎмӮ° л“ұмқҙ лі‘н’ҚмІҳлҹј л№ҷ л‘ҳлҹ¬мһҲм–ҙм„ң нҷ©лҹүн•ҳкі л“ңл„“мқҖ л“ӨнҢҗмқҙ м•„лӢҲлқј м•„лҠ‘н•ң лӘЁнғңмқҳ мһҗк¶Ғ мҶҚм—җлқјлҸ„ л“Өм–ҙм•үмқҖ л“Ҝн•ҳлӢӨ. мқҙлһҳм„ң лӮЁм„ұмқҳ м–‘кё°(йҷҪж°Ј)лҘј көімқҙ мқҙ нҒ° лҸҢмқ„ м„ёмӣҢм„ңлқјлҸ„ ліҙ충н•ҙм•јл§Ң н–Ҳмқ„к№Ң. м„ёмғҒмқҖ лӮЁмһҗмҷҖ м—¬мһҗ, мҰү мқҢкіј м–‘мңјлЎң л°ҳл°ҳ лӮҳлүҳм–ҙмһҲлӢӨ. к·ё л‘җ м„ұ(жҖ§)мқҙ мЎ°нҷ”лЎңмӣҖмқ„ мқҙлЈ° л•Ңм—җ 비лЎңмҶҢ мҷ„м „мІҙк°Җ лҗңлӢӨ. мЎ°нҷ”лҠ” кҙҖкі„мқҳ нҸүнҷ”лҘј мқҳлҜён•ңлӢӨ. нҳ•нҸүмқ„ лІ—м–ҙлӮҳкұ°лӮҳ кё°мҡ°лҠ” кҙҖкі„лҠ” л¶Ҳнҳ‘нҷ”мқҢмқ„ мң л°ңн•ЁмқҖ л¬јлЎ , кІ°көӯ лӢЁм ҲмқҙлқјлҠ” лҒқмқ„ н–Ҙн•ҳлҠ” кёёлӘ©мқҙ лҗҳкі л§ҢлӢӨ.
мқҢм–‘мқҳ мЎ°нҷ”к°Җ м„ёмғҒмқҳ мЎ°нҷ”лқјкі лҜҝм—ҲлҚҳ мӮ¬лһҢл“Өм—җкІҢ лӮЁм„ұкіј м—¬м„ұмқ„ мғҒ징н•ҳлҠ” м„ лҸҢмқ„ м„ёмҡ°лҠ” мқјмқҖ к°„м Ҳн•ҳкі м§Җм—„н•ң мў…көҗм Ғ мқҳмӢқмқҙм—Ҳмңјл©°, кұ°м№ң мһҗм—°кіј л§ЁлӘёмңјлЎң л¶Җл”Әм№ҳл©° мӮҙм•„к°Җм•ј н•ҳлҠ” мӮ¶мқҳ мң„кёүн•ң мҲҳлӢЁмқҙкё°лҸ„ н–ҲлӢӨ. м„ лҸҢмқҳ кё°лҠҘ м—ӯмӢң н’Қмҡ”мҷҖ лІҲмӢқ[еӨҡз”Ј]мқҖ л¬јлЎ мқҙкі мҲҳнҳёлӮҳ лІҪмӮ¬м Ғ м—ӯн• мқҙм—ҲлӢӨлҠ” кІғмқҖ лӢ№м—°н•ң мқјмқҙлӢӨ. к·ёкІғмқҙ м–ҙл”” мқёк°„м—җкІҢл§Ң көӯн•ңн•ҳлҠ” мқјмқҙкІ лҠ”к°Җ. н’Қмҡ”мҷҖ мҷ•м„ұн•ң лІҲмӢқмқҖ л§Ңл¬јмқҳ кё°ліём Ғ мҡ•кө¬мқҙл©° мҳҒмҶҚмқҳ н•„мҲҳ мЎ°кұҙмқҙлӢӨ.
кё°лӮҳкёҙ м„ёмӣ”м—җ лҒҢл ӨмҳӨлҠҗлқј, нҳ„лҢҖмқёл“Өмқҳ мҷёл©ҙмқ„ кІ¬лҺҢмҳӨлҠҗлқј мҙҲм·Ңн•ҳкё° мқҙлҘј лҚ° м—ҶлҠ” вҖҳм„ лҸҢвҖҷмқҳ лӘЁмҠөмқ„ л’ӨлЎңн•ҳкі лӮҳмҳӨлҠ” л°ңкұёмқҢмқҙ л¬ҙкІҒкё°л§Ң н•ҳлӢӨ. л¬јмһ¬ л§Ңмқ„ мўҮм•„ мӮ¬лҠ” мӮ¬лһҢл“Ө мқјмғүмқё м„ёмғҒм—җ мһҗм—°кіјмқҳ мҶҢнҶө л”°мң„к°Җ м•ҲмӨ‘м—җлӮҳ мһҲкІ лҠ”к°Җ. мӮ¬лһҢмқҳ нһҳмңјлЎң м•Ҳ лҗҳлҠ” кІғмқҙ м—ҶлҠ” мӢңлҢҖм—җ к·ёк№Ң짓 л°”мң„ н•ҳлӮҳм—җ мқёк°„мқҳ мҡҙлӘ…мқ„ л§ЎкёҙлӢӨлҠ” кІғмқҖ к·ё лҲ„кө¬м—җкІҢ л¬јм–ҙлҸ„ мӣғмқҢкұ°лҰ¬мқј лҝҗмқҙлӢӨ. н•ҳм§Җл§Ң м„ лҸҢмқҖ мҳҒмӣҗнһҲ м„ң мһҲлҠ” лҸҢмқҙлӢӨ. м„ң мһҲлӢӨлҠ” кІғмқҖ нҳ„мһ¬ 진н–үнҳ•мқҙл©° мғқлӘ…мқ„ к°ҖмЎҢлӢӨлҠ” мҰқкұ°мқҙлӢӨ.
м„ лҸҢмқ„ н–Ҙн•ҙ м—јмӣҗн•ҳлҠ” мӮ¬лһҢл“Өмқҙ л§Һмқ„мҲҳлЎқ м„ёмғҒмқҳ 분мҹҒмқҙ мӨ„кі мЎ°нҷ”лЎңмҡҙ нҸүнҷ”лҘј мқҙлЈ° кІғмқҙлқјкі лҜҝм—ҲлҚҳ м„ мқёл“Өмқҳ мғқк°Ғм—җ кё°кәјмқҙ нҷ”лӢөмқ„ ліҙлӮёлӢӨ. мһҗм—°мқҳ мқҙм№ҳм—җ н•©лӢ№н•ҳкІҢ л”°лҘҙл©ҙм„ң мӮҙкІ лӢӨлҠ” мқёк°„ ліём—°мқҳ кі н•ҙк°Җ м„ лҸҢм—җлҠ” мң„м„ м—Ҷмқҙ лӢҙкІЁ мһҲлӢӨлҠ” мғқк°Ғм—җм„ңмқҙлӢӨ. м„ лҸҢмқҳ мҳҒмӣҗмқ„, м•„лӢҲ мқёк°„мқҳ мҳҒмҶҚкіј нҸүнҷ”лҘј л‘җ мҶҗ н•©мһҘн•ҳкі к°„м Ҳн•ҳкІҢ кё°мӣҗн•ҙ ліҙм§Җл§Ң л©”м•„лҰ¬ м—ҶлҠ” мҷём№Ёмқё л“Ҝ к·ём Җ н—Ҳн—ҲлЎӯкё°л§Ң н•ҳлӢӨ.
лҲҲм•һм—җ мҲҳкөҝн•ҳкІҢ м•үм•„мһҲлҠ” м–ҙл“ұмӮ°мқҳ л’·лӘЁмҠөмқҙ мң лӮңнһҲ м“ём“ён•ҙ ліҙмқёлӢ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