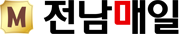지방대학의 위기는 대학 자체만의 위기가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소멸과 지역 인구 유출을 막는 ‘댐’ 역할로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지방대학들은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며 혁신모델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 미래 전략을 공유하고 사업 설계부터 인력양성, 일자리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의 위기를 타개하는 동반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입생 미충원 수두룩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이 2023학년도 수시·정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정원 3,029명을 채우지 못했다. 광주는 9개 대학 1,554명, 전남은 9개 대학에서 1,475명의 결원이 발생, 추가 모집에 나서야 했다. 광주·전남 7개 대학은 정시모집 경쟁률 1대1에 미치지 못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해마다 악전고투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를 보면 2022년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각각 98.7%, 92.7%였다. 전문대 신입생 충원율은 각각 94.4%, 83.0%로 적신호가 켜졌다.
◇대입정원보다 응시생 적어
지방대학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예견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추계에 따르면 올해 고3 학생 수는 39만8,271명으로 1년 전보다 3만2,847명 적어 내년 대입 정원보다 응시자 수가 4~5만명 가량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광주·전남 대학들은 신입생 급감에 14년째 등록금 동결로 재정 사정은 악화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 15일 발표한 ‘학생 미충원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손실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5년 전국 4년제 사립대 156개교 가운데 53개교가 운영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대학의 총운영 손실 금액은 1,684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2~2025년 4년 총합 예상운영손익이 적자로 추정된 사립대는 전체 26.3%인 총 41곳이었다. 지방대가 78.1%인 32곳으로 나타났다.
대교협 분석팀은 학령인구 절벽에 따라 향후 적자를 보일 사립대가 늘어나면서 ‘경영위기대학’ 후보군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결손은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대학보다 소규모 대학일수록,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방 사립대일수록 심각할 것으로 추정됐다.
 |
| 동신대는 지난 22일 혁신융합캠퍼스 대강당에서 챗GPT를 주제로 제4회 NEXT 전남-나주상상포럼을 개최했다. /동신대 제공 |
교육부가 지자체로 대학 지원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은 필수요소가 됐다.
정부가 대학·지자체 간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역소멸 위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도하던 대학 지원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해 소멸 위기의 지역과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는 기초지자체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10년간 이들 인구감소 지역 89곳에선 청년층 인구가 지역을 떠났고, 지역을 떠난 청년층의 3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난 원인은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대학 진학 등 문제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지자체 역할 중대 변수
교육부는 2025년부터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한다.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역할은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방대학 혁신자문단’을 통해 대학 지원과 혁신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지방대학 혁신자문단은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요구하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컨설팅을 비롯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발전방안 자문, 대학 혁신안 지원 등을 수행한다.
전남도도 대학협력전담반(TF)을 발족해 지방대학과 동반성장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전담반은 지방대학,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된 대학 지원 과제를 보완해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계획 등에 반영하는 기능을 맡는다.
◇지역특색 반영 혁신모델 필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지정 1차 관문을 통과한 전남대와 순천대는 지역 특색을 살리고 대학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모델을 제안했다.
전남대는 대학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선도하는 ‘CNU 글로컬 대학’ 혁신 모델을 제시했다. 융복합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고도화를 위해 AI 융복합 혁신 허브인 광주캠퍼스와 신기술·첨단산업 혁신 벨트인 전남 캠퍼스 등으로 구성된 MEGA-CNU 캠퍼스 체제를 구축한다.
순천대는 전남지역 특성을 고려해 강소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대학 혁신 모델을 제안했다. 전남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그린 스마트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항공·첨단소재 등 3개 특화 분야 무학과 개편 및 무학년 무학기 교육혁신 등을 계획안으로 제출했다.
지방대학들은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혁신모델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전략산업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특화 분야를 마련해 산업 연구와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당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대학 한 관계자는 “지역소멸 등 지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대학과 지자체가 파트너 돼 동반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지역 미래 전략을 공유하고 사업 설계부터 인력양성, 일자리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의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